- ‘기생충’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물 장르 확산의 구조적 배경을 밝힌 연세대 연구 2025.05.07
-
신촌 홍보팀 첨부파일( 2 ) 연구진 사진(경영대학 신동엽, 김보경, 오홍석 교수).jpg (20250507) ‘기생충’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물 장르 확산의 구조적 배경을 밝힌 연세대 연구.hwp CLOSE TOOLTIP
‘기생충’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물 장르 확산의 구조적 배경을 밝힌 연세대 연구
– 경영학·사회학·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 -
– 국제 권위 학술지 Poetics 2025년 4월호 게재 -
– 한국 영화산업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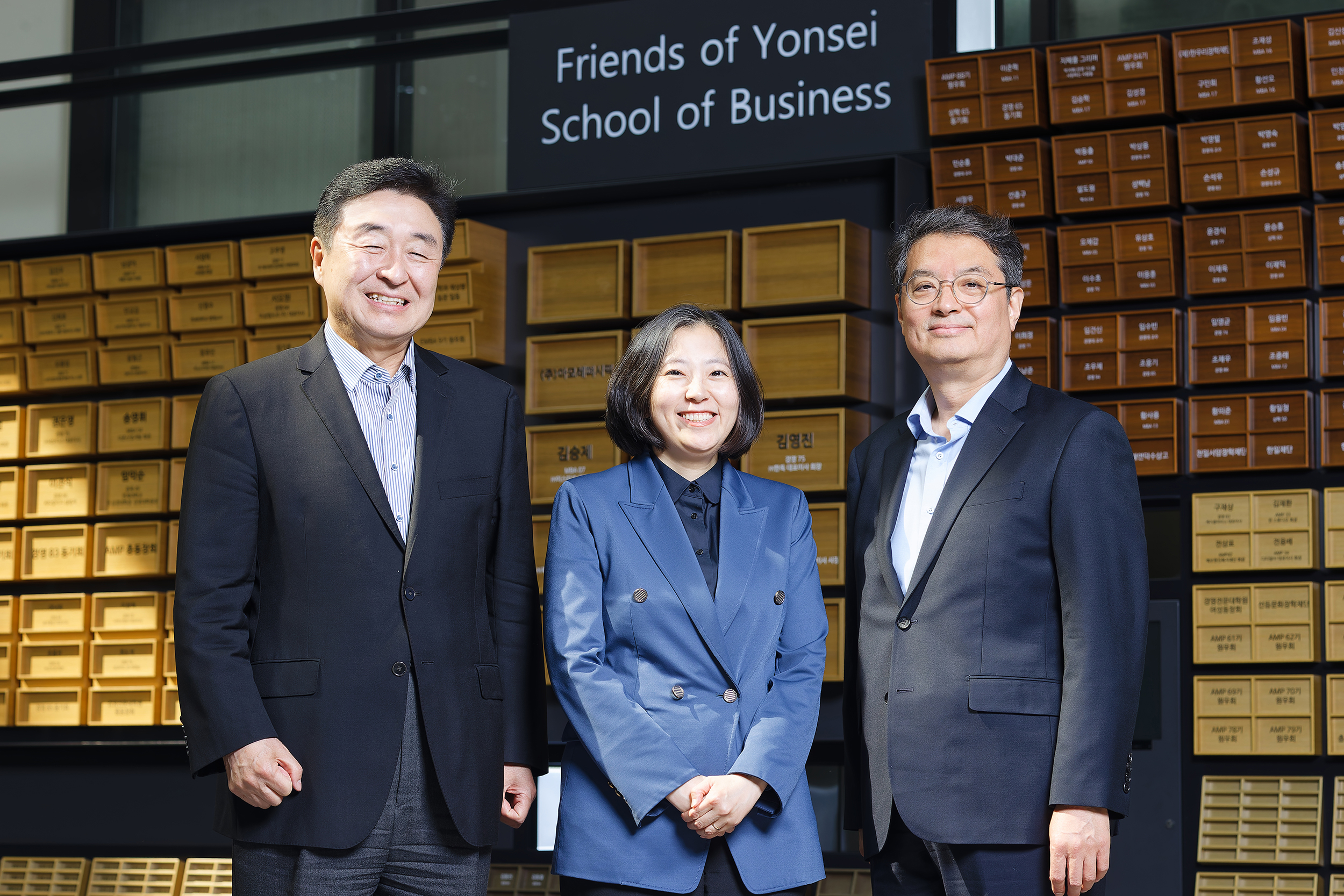 (왼쪽부터) 연세대 경영대학 신동엽, 김보경, 오홍석 교수
(왼쪽부터) 연세대 경영대학 신동엽, 김보경, 오홍석 교수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동엽, 김보경, 오홍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김선혁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 영화산업에서 사회비판적 장르인 ‘사회물’이 중심 장르로 자리 잡은 구조적 배경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영화감독의 ‘위상’과 ‘명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사회물 선택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관련 논문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 권위지 ‘Poetics’ 2025년 4월호에 게재됐다. Poetics는 문화, 예술, 미디어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융복합 연구를 다루는 세계적인 저널로, 사회학, 경영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융복합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회물은 사회적 불평등, 제도적 모순, 권력 구조 등 현실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장르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장르지만, 대중 장르로 발전한 사례는 드물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물이 예술영화를 넘어 상업영화 전반에 걸쳐 활발히 제작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블랙코미디와 스릴러를 결합해 가족 간 계급 갈등과 빈부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교하게 풀어내며 전 세계적 공감과 찬사를 동시에 끌어냈다. 이처럼 한국 영화의 사회물은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며 사회문제를 서사의 중심에 두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해 온 주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사회물 선택이 단순히 감독 개인의 취향이나 창작 성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영화산업 내 ‘위상’과 ‘명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독의 위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 산업 내 위치로, 사회적 기대와 역할 규범을 수반하는 반면, 예술적 명성은 평론가나 관객의 누적된 평가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의 위상은 사회적 역할 기대를 반영해 사회물 선택으로 이어지고, 명성은 지속적인 평가 압력에 대응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사회물 선택을 유도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영화계 종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함께,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된 한국 상업영화 1,849편에 대한 계량 분석을 병행했다. 분석 결과, 감독의 위상과 명성이 서로 다른 기제에 따라 사회물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제1저자인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지위·명성 연구, 제도 이론, 문화예술 분야의 장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융복합적인 이론 확장을 이뤘으며, 사회물 중심의 대중적 작가주의가 뚜렷한 한국 영화산업의 제도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는 최근 ㈜지누스 창업주인 G&G School 이윤재 이사장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기탁받아,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 또한 이러한 비전과 맥을 같이하며, 한국 영화산업의 제도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향후 글로벌 문화산업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연구진 사진 1장. 끝.
(연구진 사진 설명)
(왼쪽부터) 연세대 경영대학 신동엽, 김보경, 오홍석 교수
(논문 정보)
논문 제목: Who are social critics: The effects of directors’ status and reputation on the choice of social problem film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논문 주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4422X25000130



